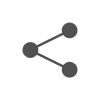설마 했는데 역시였다. 수림의 심장소리가 화장실 칸막이를 부술 기세로 날뛰었다. 침이 마르고 식은땀이 흘렀다.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팬티에는 지독하게 붉고 축축한 얼룩이 선명했다. 매번 수림을 속수무책으로 나락에 빠뜨린 생리혈 그 모습, 그대로다.
“생리가 묻지 않도록 신경 써라.”
생리를 시작하던 날 엄마는 수림에게 제일 먼저 당부했다. 수림은 생리 제1 수칙으로 여기며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매년 꼭 한두 번 수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안심할 수 있는 크기의 대형을 주로 사용했고, 잠자리에 들 땐 꼭 오버나이트를 썼다. 모든 학급생이 보는 앞에서 생리가 묻은 채 뜀틀을 한 날 이후로 밤낮없이 오버나이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대신 엉덩이에 땀띠 같은 발진을 얻어야 했다. 대학생이 돼서 친구의 추천으로 탐폰을 샀다. 하지만 착용과정이 익숙해지지 않았고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찜찜해 사놓은 것 모두 버리고 말았다.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달 어김없이 질에서 흘러나온 생리는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팬티에, 이불에, 옷에, 의자에, 시트에, 방석에… 생리가 찾아오면 수림은 신경이 곤두섰다. 생리통도 지긋했다. 수림이 살며 치른 236번의 생리는 곧 236번의 전쟁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몰랐을까’,
수림은 자책했다. 팬티에 묻은 생리혈은 이미 바지까지 번져 동그랗게 붉은 얼룩을 새겼다. 이 얼룩을 달고 어디서부터 돌아다녔던 걸까. 아침부터 만났던 취재원들의 떠올랐다. 수림이 뒤돌아선 후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무력한 자책감이 밀려왔다. 익숙한 느낌이었다. 수림이 기자가 되기 위해, 되고 나서 느꼈던 일들이 스쳤다. 언론사 입사를 위해 스펙을 쌓으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던 일. 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불합격. 화장 때문일까, 옷차림 때문일까. 당당함이 ‘드세게’ 보였을까, 겸손함이 ‘소극적’으로 보였을까. 처음 탈락한 언론사에서 1차 남성 합격자 비율이 월등히 적음에도 최종 남성 합격자가 많은 걸 보고, 아직도 여성을 뽑길 꺼린다는 소문. 그래도 버텼다. 3년을 매진해 총 9명 합격자 중에서 4명 여성 합격자 중 한 명으로 기자가 됐다. “역시 요즘 사내놈들은 여자들 못이겨”를 칭찬으로 내뱉고 “험한 취재하기 힘들면 말해”라고 배려를 해주는 부장을 만났을 때, 억지로 웃어 보이는 건 쉬운 일이었다. 취재원의 추근거림, 여성 외모순위를 매기는 동료들의 대화, 미투 무서워 대화를 못하겠다는 선배. 수림은 밖으로 향할 힘을 안으로 내어, 참아냈다. 바지에 묻은 생리 자국은 무기력하게 참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선명하게 한계를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다.
생리는 존재하지만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세 여성이 유쾌하게 뛰는 생리 광고에는 붉은 얼룩이 등장하지 않는다. 흡수력을 자랑하기 위해 생리대 위에 뿌려지는 액체도 파란색이다. 생리와 함께 생리대 역시 보이지 않는 게 미덕이다. 생리대를 숨길 주머니가 없을 때 공공 공간에서 생리대를 화장실로 운반하는 일은 꽤 난이도 높은 난제다. 생리대는 휴지처럼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다.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건 쉬울까. 누군가에게 ‘나 그날이야’라고 말할 땐 목소리를 낮춰 속삭인다. 회사에 생리휴가가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써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생리는 분명 존재하지만 어디서도 존재해서는 안 됐다. 가방으로 가렸지만 아슬아슬 보이는 수림의 바지 위 얼룩은 표식처럼 시선을 끌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한번 도 본 적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바람이 매섭던 초봄. 수림은 묵은 빨래를 미룰 수 없어 손을 걷어붙였다. 혼자 사는 단출한 살림인데 옷가지와 이불이 더해지니 빨래는 양손이 허락한 범위를 넘쳤다. 결국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빨래방 세탁기에 이불을 넣던 친구가 뭔가 발견하고 수림을 빤히 쳐다봤다. 검붉게 메마른 그 얼룩이었다. 수림은 무심히 ‘생리’라고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치를 살폈다.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무렇지 않게 세탁기에 이불을 넣었지만 수림은 집에 있을, 같은 얼룩이 묻은 또 다른 이불을 떠올렸다. 허락된 하얀 지대를 넘어 번져나간, 쓸데 없이 진취적인 얼룩. 무엇이 잘못인 걸까. 삐- 세탁이 끝났다. 생리혈이 오래돼서인지 세탁 후에도 얼룩이 흐릿하게 남았다. 마른 이불을 개는 친구의 표정을 수림은 자꾸만 흘깃거렸다.
*어라운드바디 웹진에서는 여성의 몸과, 몸을 둘러싼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무해한 글로 세상의 자극을 덜어내고, 잠시나마 우리 모두의 심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작성한 글, 소통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ROBIN@AROUNDBODY.COM 으로 보내주세요.
어라운드바디가 함께 읽고 공감한 다음 웹진에 게시 도와드리겠습니다.